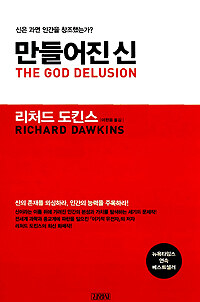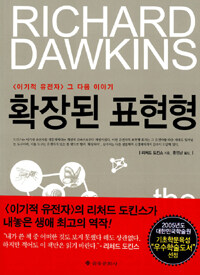생물학을 비롯한 과학 대부분은 연구자가 가설을 세우고 실험이나 관찰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전통적인 가설 기반 연구(hypothesis-driven research, 假設基盤硏究)를 중심으로 지식 체계를 구축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대부분은 연구자 개인이나 수 명 내외로 조직된 소규모 실험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연구를 편의상 (연구 주제의 중요도가 아니라 연구 규모가 작음을 뜻하는) 작은 과학(small science)이라 부르도록 하자. 물론, 과거에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실험실 사이의 상호 협력 체계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규모는 (마치 가내 수공업을 연상케 하는) 작은 과학에 머물러 있었다. 소규모로 진행되는 연구를 “가내 수공업”에 비교했다 해서 기분 상하지 않길 바란다. 사실, 나도 이런 식의 “가내 수공업” 연구에 종사하는 일개 연구 노동자다. 게다가 이렇게 멋지고 성공적인 가내 수공업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이러한 전통적인 연구 방식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바로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 때문이다. 전 세계적인 대규모 협력 연구인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의 시작은 “인간의 DNA 염기서열을 전부 파악하면 생명 현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란 물음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대단위 연구는 존 설스턴(John Sulston)과 로버트 워터스톤(Robert Waterstone)의 꼬마선충(C. elegans) 유전체 지도 작성이라는 선도적 작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1]. 인간 유전체 지도의 완결로 생명 현상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마음속에만 담아두기로 하자. 어쨌든, 반대자와 회의론자의 거센 압박을 견뎌낸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는 과거에 성공했으며 오늘날에도 성공적이니까 말이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하지만, 만약 실패했다면 생명 과학의 역사는 다른 길을 걷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의 파급 효과는 과학 전체로 봤을 때 실로 엄청났다. 이것은 단지 지식 체계의 확장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즉, 새로운 학문의 출현을 알리는 북소리였다. 실제로,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의 성공은 오믹스(Omics)의 출현을 이끌었으며, 기존의 생명과학 연구 영역도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확장되었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생명과학 연구의 흐름 자체도 많이 달라졌다. 바야흐로 (절대로 연구 주제의 중요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연구의 규모가 큼을 의미하는) 큰 과학(big science)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흔하디흔한 연구 방식이 되었다. 진심으로 바라 건데, “큰 과학”이나 “작은 과학”이란 표현에 기분 상하지 않길 바란다. 계속 강조했지만, 이것은 연구의 경중(輕重)을 따지는 게 아닌, 단지 연구 규모를 빗댄 표현이니까 말이다.
확실히,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의 성공 덕분에 큰 과학이라 불리는 대규모 연구의 발족(發足)이 증가했다. 그리고 최근 이런 종류의 연구가 『셀(Cell)』, 『네이쳐(Nature)』 그리고 『사이언스(Science)』와 같은 유명 학술지나 대중 과학지에 게재되는 빈도 또한 높아지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생명과학 연구의 트렌트(trend)가 전통적인 방식에서 탈피하고 있음을 방증(傍證)하고 있다. 더불어, 단일 연구에 투입되는 돈의 규모 또한 과거에 비해 급속히 커졌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 많은 과학자는 한결같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즉, 작은 과학에 대한 재정 지원이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 때부터 시작된) 비관론 말이다.
자신의 존재와 천지창조의 원리가 과학적으로 밝혀지길 기다리는 전지전능한 신이 존재해 연구비에 목말라 하는 과학자의 염원을 풀어줄 수만 있다면 이보다도 더 기쁜 일은 없으리라. 하지만 자연의 원리를 밝히는데 초자연적인 방법을 거부하는 과학자 다수가 초자연적인 신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도 한 편으로 웃긴 일이며, 더불어 그런 식의 제한 없는 재정 지원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 사회의 일원으로서 썩 달갑지만은 않다. 따라서 상상 속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전체 연구비는 늘 제한적이기 마련이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는 과학자, 특히 자기 실험실을 운영하는 연구 책임자라면 누구나 갖는 고민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이렇게 한정된 연구비 내에서 나날이 늘고 있는 큰 과학에 대한 재정 지원 비율이 높아진다면, 작은 과학에 돌아갈 연구비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작은 과학에 종사하는 과학자가 큰 과학의 승승장구(乘勝長驅)를 바라보며 한숨짓는 이유다.
사실, 대부분의 기초 과학 연구는 돈벌이와는 전혀 상관없다. 그러므로 이윤 추구가 최고의 미덕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벌이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기초 과학 연구에 재정 지원을 해줄 정도로 머리가 돈 사적 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아니, 아예 관심조차 없다고나 할까? 물론, 돈벌이와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기초 과학 연구가 아주 가끔 잭팟을 터뜨릴 때가 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은 거위가 황금알을 낳는 것보다도 매우 어려운 일이니 기대를 품지 않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기초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에게 정부 지원 연구비에 대한 절실함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과학자의 간절함을 풀어주기에는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가뭄 중에 가끔 내리는 쥐똥만큼의 빗방울이라도 갈증을 해결할 수 있으니 이 정도라도 어디냐며 만족해야 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데, 큰 과학에 대한 연구비 지원이 점차 증가한다면 작은 과학의 연구비 수혜는 그에 반비례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게다가, 큰 과학이 어떤 식으로든 성공적으로 끝나거나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포장된다면 그 비율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작은 과학에 몸담은 과학자 사이의 연구비 획득을 위한 치열한 경쟁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데, 심지어 어떤 과학자는 이런 상황을 빗대어 “이러다 전통적 접근법을 고수하는 연구는 절멸하는 게 아니냐”는 매우 비관적인 전망을 늘어놓기도 한다. 어떻게 보면, 일리 있어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학자 다수가 품고 있는 이런 비관론은 정말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을까? 진정, 작은 과학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태(舊態)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아니, 오히려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조처(措處)를 해야 한다. 이것은 일종의 지식 생태계 문제이며 과학의 지식 체계 구축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관한 위기의식이다. 물론,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에서 보인 것처럼 큰 과학도 중요하다. 그런 큰 과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과학적 지식의 폭과 생명 현상의 본질에 관한 물음은 더욱 다양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큰 과학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큰 과학은 나름의 방식대로 생명 현상의 전반적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데 큰 이바지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네트워크도 유전자 하나하나의 기능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헛발질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진실로, 오늘날 큰 과학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전통적인 방식의 작은 과학의 분전(奮戰) 덕분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과거에도 성공적이었던 작은 과학은 오늘날에도 그 존재가 퇴색하기는커녕 중요성은 더욱 커져만 간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작은 과학의 중요성을 설파(說破)하는 기고문 하나가 올라왔다. 생물학 전공자라면 한 번 정도 들어본 적이 있는 유명한 세포생물학 교과서인 『세포의 분자생물학(Molecular Biology of the Cell) 』의 저자이자 『사이언스』의 편집자인 부르스 앨버츠(Bruce Alberts)가 「“작은 과학”의 종말?(The End of “Small Science”?)」이란 제목으로 『사이언스』에 게재한 글이다 [2]. 그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규모 연구의 양적 확장이 있다고 해서 전통적인 작은 과학이 사라질 일은 없으며, 오히려 이런 연구가 더 많이 진행되어야만 생명 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생명과학의 연구 분야는 놀라우리만치 확장했으며, 많은 새로운 연구 분야가 탄생했다. 더불어, 인간 유전체 지도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생명 현상에 대한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마치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그보다 몇 배의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는 꼴이라고나 할까? 이런 이유 때문에 앨버츠는 그의 기고문에서 큰 과학의 확장으로 작은 과학이 절멸하는 일이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작은 과학이 이전보다도 더 활성화되어야만 과학, 즉 생명과학이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논지를 펼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잊지 않았다. “Ensuring a successful future for the biological sciences will require restraint in the growth of large centers and -omics–like projects, so as to provide more financial support for the critical work of innovative small laboratories striving to understand the wonderful complexity of living systems.” 즉, “생명과학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를 위해 작은 과학에 대한 더 많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위해서라도, 큰 과학이라 불리는 대규모 연구에 대한 재정 지원은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브루스 앨버츠의 글은 무료로 열람할 수 있으므로 꼭 한 번 읽어보길 바란다.
참고 자료
[1]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유전자 시대의 적들(The Common Thread)』 존 설스턴(John Sulston), 조지나 페리(Georgina Ferry) 지음 / 유은실 옮김. 사이언스북스. 2004년.”을 참고하길 바란다.
[2] Alberts B. 2012. The End of "Small Science"? Science. 337: 1583. [링크]